김대웅 감독의 <레슬러>는 과거 레슬링 국가대표였지만, 아들 자랑으로 살면서 아들 김민재(성웅 역)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인 유해진(귀보 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레슬러>는 레슬링 영화로 볼 수도 있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부자간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아찔한 반전이 있는 팝콘무비로 볼 수도 있지만, 영화 속 유해진의 나이가 40이 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중년의 현실과 판타지를 유쾌하고 발칙하게 담은 영화라고 볼 수 있다.

◇ 우리 시대 일상에서 일반적인 중년의 모습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시기를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눈다면, 가장 갈등이 심한 시기는 청소년기이고, 그다음으로 갈등이 심한 시기는 중년기이다. 두 시기 모두 관심이 ‘나’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인데, 관심이 ‘나’ 안으로 들어오는 청소년기와 중년기는 불안정한 시기이고, 관심이 외부 세계로 향하는 아동기, 청년기, 노년기는 안정된 시기라고 평가된다.
청소년기는 어린이로 계속 살아오던 경향과 어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부딪히는 시기이고, 중년기는 이제 더 이상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젊지도 늙지고 않은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있고, 중년기에는 사추기가 있다는 것을 통해 이런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레슬러>에서 유해진은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고, 김민재는 청소년기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중년기와 청소년기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약간은 다른 특징을 같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시기이고, 중년기는 삶을 돌이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에너지가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레슬러>에서 김민재와 유해진의 모습이 개연성 있게 와닿는다.
◇ 영화 <레슬러> 속 중년과 중년의 판타지
<레슬러>에서 이성경(가영 역)은 김민재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친절한데 아빠에게는 친절하지 않은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아들이 중년기의 아빠를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영화 속 관계성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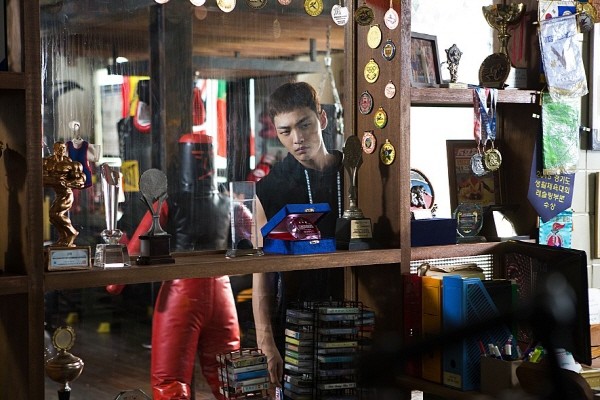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이 중년이라고 느끼는 나이가 41세라는 조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화 속 유해진은 아직 본인이 중년이라고 느끼지 않는 회피와 부정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성웅(김민재)이 꿈이 내 꿈이다.”라고 말하는 유해진은 자신의 꿈은 없고 자식의 꿈이 자신의 꿈으로 믿고 의지하는 중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당신 인생 찾아.”라는 주변의 조언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바로 흘려버리는 것 또한 그러하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에 대해 영화는 지속적인 화두를 던지는데, 이런 화두에 대한 영화의 대답은 우리나라 부모, 자식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생각된다. 아빠는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은 아빠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 각자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에만 그치는 많은 사람들을 영화 속 유해진과 김민재가 대변한다.
유해진과 유해진의 엄마 나문희(귀보 엄마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나문희가 하는 이야기와 방법을 유해진은 정말 듣지 싫어하면서도 유해진은 김민재에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현대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기 어려운 자존감 부족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특히 중년의 경우 스스로는 물론이고 같은 또래로부터 인정받더라도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보다 어린 젊은 세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제야 자존감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성과 이성의 젊은 세대 반응에 모두 해당된다.
<레슬러>에서 아들의 친구이면서 어릴 적부터 같은 집에서 살았던 이성경은 어릴 적 농담처럼 했던 유해진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용기 내 진심으로 이야기한다. 같은 또래가 아닌 젊은 세대에도 인기 있는 젊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것은 중년의 판타지로 작용하는데, 유해진에게는 이성경뿐만 아니라 엄마가 억지로 마련한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의사 황우슬혜(도나 역)까지 유해진에게 적극적인 대시를 한다.

이런 모습에 영화 속 성동일(성수 역)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경(미라 역)처럼 사람 마음은 한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객 중에는 영화 속 유해진이 되고 싶은 심경을 가진 중년도 꽤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영화 <레슬러>의 중년이 가진 차별점
만약 <레슬러>의 유해진이 전형적인 중년의 모습, 중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뻔한 이야기가 됐을 수 있고 유쾌하기보다는 불쾌함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영화 속 유해진은 예전 중년과는 달리 철없는 중년인데, 오래 사는 시대에 중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유해진은 중년 남성의 판타지를 그대로 즐기거나 갈등하기보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관객들 또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감정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 유해진에게 감정이입한 중년의 관객, 혹은 예비 중년의 관객이 죄책감보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했다는 점은 똑똑한 선택으로 생각된다.
천상욱 기자 (lovelich9@rpm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