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조 페레로, 페데리코 비아신 감독의 <아름다운 것들(Beautiful Things)>은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 국제경쟁, 에코 폴리티카 섹션에 출품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인간의 강박적 소비에 일침을 날리는데, 사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바라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어필에 주력하기보다는 관객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함으로 한정해 영상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영화를 보는 사람이 방어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영화 속으로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 무분별한 소비, 강박적 소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나간다! 사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바라본다!
무분별한 소비, 강박적 소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영화 관람 전에 상상하면 무절제와 무계획, 과시의 욕구, 심리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방어기제, 매스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의 과도한 부추김, 개인의 성향, 일반적인 인간의 습성과 습관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아름다운 것들>은 강박적 소비의 원인을 직접 가정해 연결하기보다는, 수집한 수많은 물체의 탄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공통적인 지점과 원인을 파헤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직관적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명백한 것들을 찾아나서는 과정과 여정에 관객들은 더욱 공감할 수 있다.

만약 직관적으로 정답을 찾으려고 했으면, 교양 프로그램을 볼 때처럼 관객을 빨리 깨닫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아름다운 것들>은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관객이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강력한 일침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 돋보인다.
실제 관람하면 영화는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는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으로 객관화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더욱 감정이입해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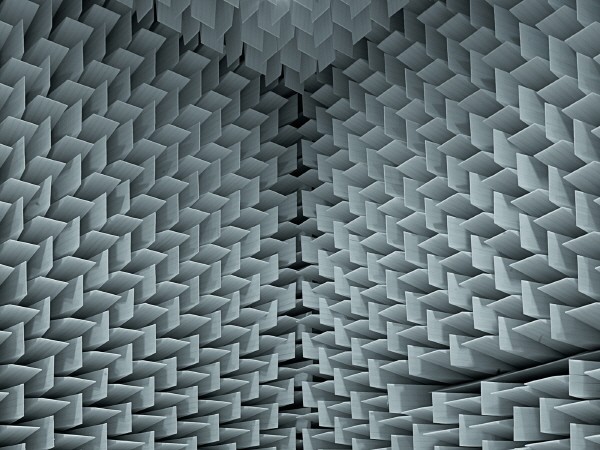
사건을 다룰 때 사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선택의 하나일 수 있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제품의 생산과정 중에 만들어진 사회구조에 적응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우리는 아무 자각 없이 무작정 따라가고 있었던 것인가?
<아름다운 것들>에서 물체의 탄생을 찾아 나서며 도달한 어느 조용하고 한적한 공장부지에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일련의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폭식과 같은 무분별한 소비, 강박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라이프스타일이 고착화되는 것은, 사람들이 제품의 ‘생산-운송-상업화-폐기’ 과정에 너무 익숙하게 적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독은 무의식적으로 떠올린다.
결국 제품의 생산과정 중에 만들어진 사회구조에 개인들이 적응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이 결정됐는데, 우리는 아무 자각 없이 무작정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름다운 것들>을 관람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다.

<아름다운 것들>은 교향곡을 닮은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교향곡에서 제1장에서부터 축적되기 시작한 정서는 제2장, 제3장을 오롯이 느끼며 공감하다 마지막 음이 연주된 후에 완성된 감동의 여운을 남기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의 거대한 이야기는 영화 중간의 완급과 강약을 모두 느끼며 집중할 때 마지막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름다운 것들>은 일침을 가하는 다큐멘터리이긴 하지만, 영상의 소재와 내용이 과도하게 거북하거나 혐오스럽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독은 자극적으로 어필하기보다는 차분히 더 깊숙한 곳으로 관객을 데리고 가는데, 관객은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느끼고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은 공감과 힐링의 긍정적 여운이라는 측면에서 무척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천상욱 기자 (lovelich9@rpm9.com)







